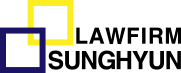[민사] 광고모델 K씨의 갑작스러운 군입대와 품위유지 위반을 근거로 모델료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8-08본문
서론
본 사건은 2020년 가수 K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모델료 청구(원고의 본소) 및 계약 해제·손해배상(피고의 반소) 관련 분쟁입니다.
2020년 6월과 7월, 피고(음식점업체)와 원고(K씨 소속사)는 총 2억 4천만 원 규모의 주스 및 마스크팩 광고모델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각 1년으로, 즉 2021년 6월과 7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K씨는 불법도박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2020년 9월 군에 입대했고, 이에 따라 계약 2개월 만에 광고 활동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위반과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2021년 2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모델료 1억 6천4백만 원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근거로 이미 지급된 모델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피고 측 대리인(성현)은 첫째, K씨가 계약상 의무인 3회 광고 촬영과 3회 행사 참여 중 각 1회만 수행해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계약 체결 후 2개월만에 갑작스러운 군 입대 사실이 발생했으나, 원고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피고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씨와 원고가 선복무 신청을 직접 진행했고 희망 복무 시기를 선택했음을 근거로, 군 입대 시점을 알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불법도박 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광고 효과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계약서상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 및 해지 조항의 정당한 행사임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델료 지급을 지연한 후 계약 해지를 들먹이며 미지급하고자 했다며 남은 모델료를 지급하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 달 후 모델이 갑작스레 입대한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게 된 후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 모델료를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모델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지 못했고, 군 입대 및 불법도박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고물이 이미 발표 및 사용되어 원고가 지불한 모델료가 전액 반환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또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7천만 원 지급을 명령해 피고의 반소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광고모델 계약에서 군입대 및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불이행과 고지 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효과를 중시하는 계약 특성상 계약서상의 품위유지 및 해지 조항의 실효성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본 사건은 2020년 가수 K씨를 광고모델로 기용한 계약에서 발생한 미지급 모델료 청구(원고의 본소) 및 계약 해제·손해배상(피고의 반소) 관련 분쟁입니다.
2020년 6월과 7월, 피고(음식점업체)와 원고(K씨 소속사)는 총 2억 4천만 원 규모의 주스 및 마스크팩 광고모델 계약을 각 체결했습니다. 계약기간은 각 1년으로, 즉 2021년 6월과 7월까지였습니다. 그러나 K씨는 불법도박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2020년 9월 군에 입대했고, 이에 따라 계약 2개월 만에 광고 활동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이에 피고는 계약 위반과 이미지 손상 등을 이유로 2021년 2월,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된 모델료 1억 6천4백만 원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근거로 이미 지급된 모델료 반환과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성현의 조력 및 사건 결과
피고 측 대리인(성현)은 첫째, K씨가 계약상 의무인 3회 광고 촬영과 3회 행사 참여 중 각 1회만 수행해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계약 체결 후 2개월만에 갑작스러운 군 입대 사실이 발생했으나, 원고가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피고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K씨와 원고가 선복무 신청을 직접 진행했고 희망 복무 시기를 선택했음을 근거로, 군 입대 시점을 알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셋째, 불법도박 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가 광고 효과와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계약서상 명시된 품위유지 의무 및 해지 조항의 정당한 행사임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모델료 지급을 지연한 후 계약 해지를 들먹이며 미지급하고자 했다며 남은 모델료를 지급하기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한 달 후 모델이 갑작스레 입대한다는 사실을 기사로 알게 된 후 원고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원고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했으므로 해당 시점 이후 모델료를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일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미지급 모델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지 못했고, 군 입대 및 불법도박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손상 등 귀책사유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광고물이 이미 발표 및 사용되어 원고가 지불한 모델료가 전액 반환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또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7천만 원 지급을 명령해 피고의 반소를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광고모델 계약에서 군입대 및 사회적 물의로 인한 계약 불이행과 고지 의무 위반이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 효과를 중시하는 계약 특성상 계약서상의 품위유지 및 해지 조항의 실효성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